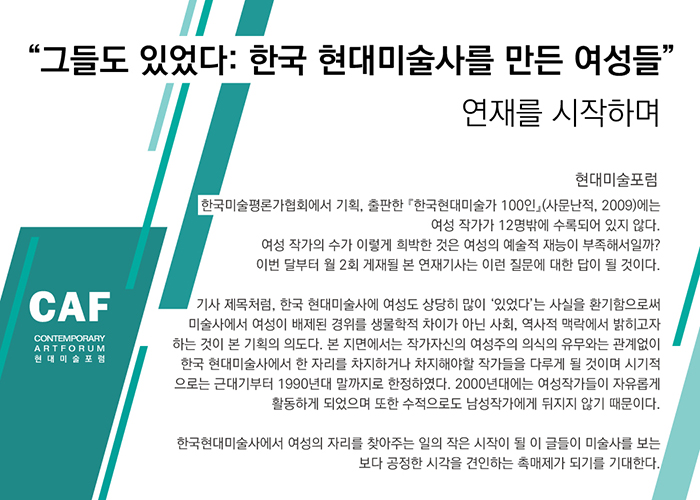황주리의 ‘타피스트리’, 그리기와 쓰기를 통한 관계들의 직조
최근 부산시립미술관에서는 1980년대 한국 형상미술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전시가 열렸다. 형상미술은 이미 2007년 같은 미술관의 전시 《도큐멘타 부산III: 일상의 역사》에서 단색조 회화와 민중미술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미술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번 전시는 당시 지역미술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했던 형상미술의 의미를 환기시키면서, 현실과 일상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서사적인 특성이 회복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황주리(1957-)의 회화 또한 이러한 형상미술의 특성과 교집합을 이룬다. 작가는 스스로를 ‘이미지 수집가’라고 부르며 인물들을 관찰하고, 이를 가독성 높은 이미지들로 화면을 가득 채운다. 이는 주류 미술계와 거리를 둔 채 자신만의 화법을 구축해 온 노력의 결과이다. 화가로서의 전격적인 그의 행보는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1980년 이후 시작되었다. 이듬해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열린 첫 개인전에서 그는 <데드마스크>(1981)와 <Broken Rules>(1981) 등을 출품하면서, 앵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 등의 회화적 기법을 경유하여 구상회화의 가능성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황주리는 사실적 재현이 아닌 단순화하고 일그러진 인물들로 화면 전체를 채우기 시작했다. <가면무도회>(1982-) 시리즈 작품에서와 같이, 익명적 군상들은 “메마를 대로 메마르고 황폐해진 이 시대에 고독한 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1) 의 모습이었다. 그는 바둑판이나 세포막을 연상시키는 구획된 틀 속에 이들의 초상을 담았다. 이는 마치 권역을 분할하여 과도한 산업화 과정을 추동해 온 한국 사회의 특수성 속에서, 자유로운 개인의 삶이 실종된 현실을 은유한 듯 보인다. 황주리에게 비친 당대 미술계 또한 이러한 사회 현상이 반영되고 있었다. 당시 한국 미술계는 1970년대 등장한 단색조 회화의 약진 속에서 이른바 추상과 구상의 양강 구도 체제로 넘어가고 있었다. 다양한 인물과 사물들이 혼재하는 황주리의 그림은 일상사의 모습들을 통해 형식주의 미학에서 배제해 온 일상을 복권시켰다. 또한 인간의 실존적 고통을 구현한 작업 과정은 사회변혁을 꾀하고자 한 민중미술과도 다른 노선이었다.
이러한 행보는 의식적으로 남성작가들이 집단적 활동을 통해 한국 미술계에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의도와는 거리를 둔 결과다. 1986년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그의 <자화상>(1986)에는 그의 고민이 잘 나타난다. 그것은 우울과 번뇌에 짓눌린 작가의 초상으로, 꿈의 무게에 짓눌려 괴로워하던 작가는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는, 고독한 예술가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황주리는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미 화가로서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한다. 그는 남성 작가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감각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작업에 돌입하면서, 20대 후반에 이미 수차례의 개인전 외에도 피악(FIAC, Foire Internationale d’Art Contemporain) 참가(1984), 석남미술상 수상(1986) 등 화려한 경력을 보유하게 된다. 그의 예술 세계는 ‘회화의 복권’(김대원, 2001) 혹은 ‘인간에 대한 조형적 탐구’(신항섭, 1994)로 논의되는데, 이는 미술과 타 분야, 작가와 사회, 인간과 비인간 간의 새로운 관계 모색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모두 ‘관계들의 직조’라는 공통된 목표를 바탕으로 한다. 바로 작가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삶의 타피스트리’로 명명한 배경이다.
우선 황주리 작업의 독자성은 여러 기법과 예술 영역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그의 작품은 수많은 형태와 색채, 이야기들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맥시멀한 화면은 상당 부분 긁기라는 제작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긁기라는 방식은 당시 단색조 회화를 위시한 추상회화에서 사용된 묘법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황주리는 회화의 형식 탐구 대신 미술 밖의 일상으로 눈을 돌렸고, 백색미학 대신 원색이나 흑백의 색을 선택했으며, 단조로운 중성적 화면 대신 다채로운 형상들을 부활시켰다. 그림 외에도 다수의 책을 출판해 온 황주리에게 있어서, 그리기와 쓰기는 씨실과 날실처럼 긴밀하게 얽힌 작업방식이다. 이러한 특성은 원고지라는 재료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출판사였던 신태양사 대표 황준성의 딸로 태어난 그의 집에는 원고지가 쌓여있었다고 한다. 어린 시절 말이 적어서 어머니가 그림을 배우게 했다는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출판사 경영자인 아버지와 국문과를 전공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작가에게 원고지는 말보다도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데 용이한 표현매체였을 것이다. 실제로 <추억제>(1983-)의 경우, 각 장의 원고지 위로 삽화들이 혼재해 있는 모습이다. 그의 작업노트에서와 같이 “너와 나의 초상들”이 “얼핏 보면 화려한 축제처럼 술렁이는 혼돈과 무질서”한 상태로 원고지 위에 그려져 있다. 그리기의 도구가 원고지와 마커라는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 그리기와 쓰기가 일종의 자웅동체적 표현기법임을 가늠하게 한다.
1987년 유학을 떠난 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이어온 황주리는 현대인들의 일상적 삶의 단면들을 담담히 관찰한 후 무채색이나 고채도의 원색 위에 안착시켜 왔다. 무엇보다도 <땅에서...>(1989-) 및 <추억의 고고학>(1993-) 시리즈에서와 같이, 동시대 현대인들과 사물의 관계를 엮어내고 있다. 캔버스 정중앙에 눈이 달린 기물이 위치하고 인간과 사물이 결합된 단순한 형태가 등장한다. 이와 같이 사람과 사물이 균등한 지위를 차지하는 그의 작업은 그리드 형식의 서술적 구조 속에 배치되어 가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상화하게 하는데, 브레히트(Bertolt Brecht)의 연극이론에서와 같은 ‘거리두기 전략(Distancing effect)’이 연상되는 지점이다. 황주리 작업에 자주 등장하는 눈과 안경이라는 소재는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준다. 1990년대 이후 그의 작품에서 눈은 신체에서 탈각되어 하나의 소재로서 사물과 결합하거나 때로는 안경과 함께 화면 곳곳에 등장한다. 안경 너머로 구경꾼이 되고자 한 작가는 내재화된 감시를 넘어, 현실을 대면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림 속 눈은 주체와 객체의 영역을 넘나들며 객관적 현실인식에 대한 작가의 의지를 대변한다.
이러한 특성은 형상을 그림에 복귀시켰던 극사실주의 작업을 연상하게 한다. 그러나 재현과 실재 사이의 경계에 대해 질문하는 극사실주의 화가들과 달리, 황주리는 사람들의 일상적이고 다채로운 이야기들에 주목한다. 극사실주의 화가들은 일상적 대상이 위치한 맥락을 제거한 채 유사-물성을 구현하였다면, 황주리는 대상을 동시대인들의 삶 속에 배치하여 인간과 사물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한다.
‘관계들의 직조’ 과정은 점차 그 범위를 넓혀 왔다. 40년 넘게 이어져 온 그의 작업이 여성 작가로서의 주체성 자각과 화가로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행보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는 사실과도 그 궤를 같이 한다. <맨하튼 블루스> 시리즈에서와 같이, 편집된 한권의 책을 연상시키는 황주리의 그림들은 그의 산문집에서의 서술적 담화가 색과 형태로 번안된 시각적 버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당시 <자화상> 시리즈에는 프리다 칼로(Frida Kahlo)와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의 작품에서 여성 특유의 감각을 발견하면서 자신을 직시하는 여성작가의 고뇌와 확신들이 순차적으로 발견된다.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나 펄 벅(Pearl Buck)을 대지처럼 넓은 모성의 여인으로 의식하고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 2) 하는 작가에게, 그리기와 쓰기는 자기연민을 넘어선 여성의 독립적 글쓰기에 가깝다.
1990년대를 넘어가면서 작가의 자화상은 다른 종들과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접합을 시도한다.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식물인 선인장은 가족의 연대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는데, 그에게 선인장은 사람을 가장 많이 닮은 강한 생명력의 상징이자 ‘서로 상처주지 않고 공존하는 이상향’ 3) 의 기호이다. 특히 그는 <자화상, 내 이름은 베티>(2003)에서 가족의 반려견이었던 베티와의 관계를 토대로, 반려종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닌 사랑을 통한 친밀한 관계로 이미지화한다. 자연과 인간 간의 상호교감적 이해는 <식물학> 시리즈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각각의 인물과 에피소드는 생장하는 식물 이미지와 결합되면서 얽히고설켜있는 유기적 관계에 놓인다. 그는 자신을 자연과 동일시하거나 여성을 남성 의존적 존재 혹은 완전한 독립적 개체로도 인식하지 않는다. 그는 여성을 억압하는 부조리한 현실보다는 인간의 공통적인 희노애락에 주목하고, 민족적 대서사도 아닌 개인의 서사와 서로 간의 이야기를 통해 기묘한 관계를 생성해 나간다.
이러한 형상을 통해 작가는 모든 생명이 함께 구성되어가는 관계에 있음을 감각적으로 포착하고, 작가와 환경 간의 끊임없는 교감의 순간을 기록해 오고 있다. 황주리의 작업은 자족적인 관념의 세계나 지역적 표제를 벗어나 타자와 인간을 넘어 비인간까지 연결망을 확장시키며, 다나 해러웨이(Donna Haraway)가 말한 공동생산(sympoeisis)의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최근 개인전 《그대 안의 붓다》(노화랑, 2021)에서 수많은 붓다를 그린 작가가 자신의 작품은 종교적 신념과는 상관없음을 강조한 부분에서도 이는 잘 드러난다. 4) 붓다라는 종교적 ‘인물’은 현실에서 관계에 대한 인식 행위를 중시하는 작가적 관점을 대변할 뿐이다. 해러웨이가 마치 어디에도 없는 곳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정복적인 힘을 강조했듯이, 황주리는 자연과 여성, 그리고 구상과 내러티브를 열등한 위치에 놓았던 남성들의 논리에서 탈피할 뿐만 아니라 시대와 종교로부터 해방된 관점을 토대로, 서로 존중하고 공생하는 관계망을 작품에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황주리는 이처럼 인간 실존의 문제를 시작으로, 주체로서의 자각 과정을 거쳐, 주체와 객체,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간사가 본래 규정된 범주들을 뛰어넘는 관계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이른바 현시해 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작가의 그림과 글은 세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형상화하는 동시에 한국 미술계에 다양성의 토대를 마련해 온 ‘타피스트리’이다.
박윤조(1975~), 이화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 이화여대 강사
ㅡㅡㅡㅡㅡ
1) 황주리, 「인간에 대한 大河그림」, 『황주리 도록 세트』, 생각의 나무, 2007, p. 9.
2) 황주리,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 1991, 자유문학사, pp. 183-184.
3)《Botany》 전시 서문, 2018, 세브란스 아트 스페이스.
4) 황주리와의 인터뷰, 2021년 6월 14일, 작가의 작업실.
황주리, <가면무도회>, 1986, 캔버스에 아크릴, 270×435cm
황주리, <자화상>, 1986, 원고지에 아크릴, 75×45cm
황주리, <추억제>, 1985, 원고지에 오일마커, 45×71cm
황주리, <자화상, 내 이름은 베티>, 2003, 캔버스에 아크릴, 61×46cm
황주리, <식물학>, 2019, 캔버스에 아크릴, 259×194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