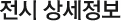상세정보
우리가 환영(歡迎)이라 믿었던 개발의 공간들은 결국 환영(幻影)으로 사라졌다. 한때 더 높이,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짓는 것이 곧 발전이며, 자본이 머무는 방식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건물만 남고 사람은 사라졌다. “환영합니다”라는 인사는 끝내 텅 빈 메아리로 울릴 뿐이다. 이 잔해들은 단순한 실패의 흔적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가 만든 필연이자, 인간의 욕망과 경제 구조가 남긴 자취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개발과 소멸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황폐해진 건물들을 마주한다. 그것들은 쇠락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체처럼 성장하고 소멸하는 도시의 자연스러운 순환의 한 장면이다. 그러나 이 풍경을 마주하는 나의 태도는 단순히 연민이나 비판에 머물 수 없다. 나는 그 속에 살았던 당사자가 아니기에, 그들의 사연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기록할 의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잔해들은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시대와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IMF 이후 부모 세대의 헌신으로 회복된 경제, 대학의 황금기, 부동산 불패 신화와 개발 열풍 속에서 우리는 자라났다. 그 시절의 선택과 집단적 확신이 오늘의 풍경을 만들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멈출 수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았던 공범이다. 이 잔해들은 우리의 “미필적 고의”가 남긴 증거다. 사진은 언제나 사라짐을 기록해 온 매체다. 이 작업은 단순히 폐허의 목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붙잡고 잊힌 기억을 불러내는 행위다. 카메라는 죽어가는 공간을 다시 살려내고, 이미 사라진 목소리를 또 다른 언어로 환생시킨다. 사진은 죽음을 증명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생명을 부여하는 기묘한 장치다. 이 풍경은 특정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압축 성장과 붕괴, 개발주의와 투기, 그리고 그 결과의 공백을 응축한다. 지방 곳곳에 버려진 콘도, 리조트, 산업단지들은 한때 “미래의 번영”을 약속했지만, 지금은 잔해로 남았다. 그것은 과거의 흔적이자,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경고이며, 반복을 막기 위한 기록이다.
결국 환영(歡迎)이라 불리던 공간은 환영(幻影)으로 바뀌었다. 인간은 끝없이 욕망을 환영으로 포장하고, 그 환영이 깨지면 또 다른 환상을 좇는다. 폐허는 실패가 아니라, 환영과 환상의 순환을 시각화하는 비유다. 이 사진 속 풍경은 인간 문명의 욕망과 좌절이 반복되는 신화적 윤회의 한 장면이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 우리는 디스토피아를 상상하며 두려워하지만, 미래 세대는 지금의 잉여와 폐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아낼지도 모른다. 오늘날 쓰레기라 불리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권력과 생존의 자원이 될 수 있다. 잔해는 더 이상 단순한 폐허가 아니라, 또 다른 질서 속에서 시작될 새로운 순환을 예고한다. 결국 이 공간들은 죽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억이고, 선택의 결과이며, 아직 끝나지 않은 윤회의 서사다. 이 기록은 우리가 환영을 꿈꾸었으나 끝내 환영에 머문 시대의 자화상이다.
관련행사
전시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