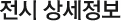상세정보
재단법인 한원미술관은 한국화 장르 전시 활성화를 위한 정례 기획전 2015 그리기의 즐거움: 畵歌* 《경계의 자리》전을 3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총 10주간 개최한다. 2010년 제 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써 6회 째에 접어드는 이번 전시는 ‘한국화’로 분류되는 작가들이 더 이상 매체로 인한 주목이 아닌 저만의 예술성과 정체성이 담긴 작업으로 주목 받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대의 감성과 정서를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가는 3인 작가들을 통해 사회변화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오늘의 시대와 호흡하는 한국화의 적극적인 모색을 발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전시기간 중에는 미술계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전문가들의 리뷰의 장인 <포트폴리오 크리틱>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신진 한국화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을 스스로 진단, 처방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깊은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화가(畵歌)전은 침체된 한국화 장르 전시의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상반기 정례기획전으로 ‘畵歌’는 그림의 노래, 즉 젊은 작가로서 당당히 자신의 작업에 몰두하며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화가들에 대한 열정의 칭호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경계의 자리
한국화는 지난 100여 년 동안 끊임없는 담론을 생산해냈다. ‘한국화’라는 용어 사용의 범위와 정당성, 작가와 작품을 분류하는 기준의 모호함, 급기야 한국화와 서양화의 경계를 없애고 회화로 통합해야 한다는 용어 존폐의 위기까지 위태로운 행보를 거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스스로를 ‘한국화가’로 부르는 젊은 세대의 작가들은 전통성과 현대성이라는 이분법적 딜레마에서 한 발 물러나 끊임없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며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한국화 담론의 흐름에 따라 (재)한원미술관의 화가전도 많은 변모를 거쳐 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시대 미술의 흐름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매체의 힘과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그 근간에는 현대의 감성과 정서를 자신만의 독특한 조형방식으로 풀어가는 작가들이 존재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화’라는 매체에의 주목이 아닌 그 이면에 담긴 예술성과 정체성을 발견하는 일이다.
2015년 그리기의 즐거움: 畵歌《경계의 자리》전은 ‘나’의 이야기이자, ‘나’를 둘러싼 주변의 이야기, 나아가 주변을 에워싼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다. 표현 매체의 뿌리를 전통적 재료에 두면서도 내용면에서 동시대 의식의 흐름과 함께하는 참여작가 3인 김남수, 문기전, 이나림은 모두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하여 주변 세계와의 관계에 질문을 던진다. 외부와 만나 자신 내부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이들의 시도는 가장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창조의 근원인 ‘봄(vision)’의 행위를 근간으로 한다. 이들에게 ‘봄’이란 세계 안에서의 체험이자 모든 감각을 동원한 순수한 경험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그들에게 있어 시각은 ‘봄’을 위한 유일무이한 감각이 아니며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향기 등 모든 감각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대상을 진정으로 발견한다.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주체와 객체와의 경계를 허물고 사물을 보는 것을 넘어 사물 사이에 상호 침투하여 역동적으로 교차하는 관계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보는 주체인 화가 자신과 보여지는 것, 즉 화가가 바라보는 세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심오하게 통찰하여 예술로써 재현하는 것이다.
“숲 속에서, 숲을 바라본 것은 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자주 반복해서 느꼈다. 어느 땐가 여러 날에 걸쳐 나는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 나무들이었음을 느꼈다. 나 자신은 말을 들으며 거기에 서 있었다. 화가는 우주에 의해 꿰뚫어져야지 우주를 꿰뚫으려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나는 내적으로 가라앉고 매장되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여기에서 솟아 오르기 위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앙드레 마르샹(André Marchand, 1907~ )의 위와 같은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화가란 존재의 근본적인 영역을 내면의 눈을 통해 보고 느끼고 대화하는 존재이며 예술은 그것의 시각화된 표현이다.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이 자립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불가능한 비가시적인 것일지라도, 오히려 보이는 것 이면에 숨어 스스로를 대변하며 존재한다. 메를로 퐁티(Maurice Merleau Ponty, 1908~1961) 유고집 제목이기도 한『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개의 개념이지만 그는 가시성과 비가시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無)’가 아닌 부재일 뿐이며, 보이는 것에 의해 열리는 또 다른 차원성이라고 정의하였다. 화가는 세계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매체를 통해 이 부재에 가시성을 부여하는 존재,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통찰력을 가진 존재인 것이다.
경계의 자리에서 존재를 탐색하다
6번째 화가전의 참여작가 3인은 모두 ‘비가시적인 어떤 것’을 본다. 김남수는 숲을 바라본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나무들이 모여 조화를 이루는 숲은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움직임을 내포하고 있다. 요란하지 않은 숲의 움직임이 빚어내는 은은한 변화는 깊고 그윽한 풍취를 돋운다.
작가는 깊은 밤에서 동이 틀 무렵까지 만물이 잠든 새벽 시간의 숲에 주목한다. 낮도 밤도 아닌 모호한 시간성을 지닌 새벽은 인간의 의식이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 시간대이기도 하다. 시공간이 멈춘 듯한 몽환적인 새벽 숲에서 그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사유에 몰입하여 삶을 성찰하고 끊임없이 정체성을 찾아나간다.
사유의 흔적이 축적되어 드러나는 존재의 현존성은 수묵이 발현하는 신묘(神妙)한 색과 우연하면서도 인위적인 필(筆)의 움직임에 한지의 결이 더해져 더욱 풍부하게 발현된다. 먹과 물이 혼합하여 얼룩지고 번지는 과정, 의도적으로 필(筆)의 흔적을 드러내고 뭉개는 모든 과정은 작가의 사생과정에서 축적된 숲의 단상이며 숲과 작가와의 교감의 흔적이다.
문기전은 삶 이면의 내재적 폭력성에 주목한다.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시나브로 죽음에 가까이 다가간다. 유한한 시간의 소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수많은 사회체계와 집단 관계로 얽혀 있다. 또한 문명의 발달로 과잉 정보가 범람하고 막대한 에너지가 소비되는 현 시대에 우리는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기계에 의해 측정, 제한당한다. 작가는 죽음과 삶이라는 근원적 질문에서 시작하여 현대 사회가 주는 이러한 억압된 요소들을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해석하고, 생성과 소멸의 불가분성을 바탕으로 한 삶의 시간 속에서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자신과 타자에 모두 질문을 던진다.
그는 한국화 질료의 특성을 잘 살려 추상적인 ‘폭력’의 이미지를 형상화시킨다. 여기에 유토피아를 갈망하는 현대인의 의지-기쁨, 행복, 여유로움 등-를 의도적으로 극명하게 대조하여 한 화면에 그려낸다. 돌가루와 라바바인더, 호분으로 이루어진 표면 위에 겹겹이 색을 쌓아 올리고, 수묵의 번짐 효과를 더하여 강렬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의 그림은 현실과 이상의 경계에서 오늘도 유토피아를 꿈꾸는 현대인들에게 참된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을 유도한다. 나아가 진정한 유토피아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허무한 이상향이 아닌,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희망적 존재임을 일깨운다.
이나림은 작가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 속 사물의 움직임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그려낸다. 작가가 바라보는 주변 공간은 무심한 듯 흘러가는 우리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삶 안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제도와 사회적 체제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생겼는지 크게 의식하지 못한 채 늘 존재해왔던 것 같은 객관성을 부여한다. 삶의 매 순간을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체제의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작가는 이렇게 제도화된 사회의 틀 안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주변 사물의 움직임에 빗대어 주체적인 삶의 의의에 대해 고찰한다.
작가의 시선에 의한 대상의 지속적인 관찰은 해체와 재구성을 거쳐 드로잉적 요소로 한 화면에 중첩된다. 장지에 먹을 기본으로 하되, 연필과 목탄을 함께 사용하여 그리고 지워내고 다시 그려 넣기를 반복한다. 그의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축적된 결과물 이전에, 수동적인 움직임을 그려내는 반복적인 행위 자체이다. 그리기의 행위를 통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찾아나가는 그의 행보는 미완의 열린 결말이며 다음 단계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상 3인 작가는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는 예술의 본질을 깨닫게 한다. 존재에 대한 사유의 흔적을 축적하여 새벽 숲의 이미지로 형상화시키는 김남수, 삶 속에 존재하는 죽음과 현대사회가 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을 유토피아적 모티브와 결부시켜 표현하는 남기전, 짜여진 틀 속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일상 공간 속 오브제에 빗대어 그려내는 이나림, 이들이 표면적으로 그려내는 것은 모두 다르지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그들만의 시각으로 보고 느끼고 해석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지닌다. 이번《경계의 자리》전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잠들어 있는 삶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존재와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사유의 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껍질이 아닌 내면을 보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의 자리를 끊임없이 탐색하는 3인 작가의 여정은 우리에게 일상적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활로가 되어줄 것이다.
(재)한원미술관 큐레이터 이지나
작가 및 작품 소개
김 남 수 Kim Namsoo
숲(새벽, 해질녘) 작업은 존재의 물음을 통한 실제와 가상의 이중적 관계 이야기이다. 작업은 현상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관심과 사유에서 비롯된다. 일상 속에서 자연(숲)은 늘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 숲은 은폐적 숨김을 통해서 조심스레 존재의 현시로 드러난다. 숲의 이중적 모호성은 본성에 관한 예술적 사유와 환영으로 나타난다. 본성은 타자(숲)의 환대를 통해 비로써 존재의 현존성으로 나타나며 가만히 앉아 숲을 응시하면 숲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그 숲은 지각되는 대상의 의식과 기억 속 찰나의 순간인 무의식의 충돌이자 흔적의 발현이다. 사생의 경험을 통한 숲과의 교감은 본성과 감각이 뒤섞이고 낯 설음에 대한 익숙함으로 다가온다.
숲 시리즈는 낮과 밤이 공존하는 경계의 모호함과 본성의 사유 흔적이 존재하는 모호한 형상을 구축(은유화)하는 작업이다. 낮과 밤의 경계는 모호한 시공간성을 연출한다. 이 경계의 모호한 세계(시공간)는 나의 감성과 나의 본성이 충돌하고 사유하는 장이다. 나는 사유의 극한지점으로의 몰입의 순간(실제와 가상의 이중성)을 수묵의 느낌으로 풀어낸다.
작품은 한지의 결을 살려 숲이 지니는 움직임의 동세를 자유롭게 은유화 시켰으며 시간의 흔적이 쌓이듯 무수히 셀 수 없는 먹의 흔적들이 존재적 현존성을 드러낸다. 또한 필의 끊임없는 반복, 투영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숲의 원천(자연순환의 불변성)을 드러내고 있다. 우연이라는 존재론적 흐름(무위)과 쌓임(인위)이라는 존재론적 욕망이 혼돈하는 사유, 흔적의 표현이다.
학력
2015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미술학 동양화전공 수료
2009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2004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2014 풍경 속 풍경전, 갤러리 도스 기획전, 갤러리도스, 서울
2013 익숙한 풍경전, 우진문화재단 청년작가 초대전, 우진문화공간, 전주
2011 산조山照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2010 여묵적료如墨寂寥전, 갤러리 이즈, 서울
단체전(selected)
2015 제6회 畵歌전 '경계의 자리', (재)한원미술관, 서울
2014 신세계미술제 선정작가전, 광주신세계갤러리, 광주
2014 Position전, 경민현대미술관, 경기 의정부
2014 White & Blue전, 갤러리 앨리스, 경기 광명
2013 이탈적 공감전, 영아트갤러리, 서울
2013 한중 수묵화 교류전, 한전아트센터, 서울
2012 Korea contemporary art, Gallery ArtPark, karlsruhe
2012 Basel selection artfair, Basel Art center, Basel
2011 생활의 발견전, 부평아트센터, 인천
2010 인천미술은행 신규 소장품전, 인하대학교 병원, 인천
2010 대한민국 청년작가 초대전, 한전아트센터 갤러리, 서울
작품소장
관동사,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인천문화재단
문 기 전 Moon Kijeon
나의 총체적 화두는 죽음, 그리고 삶이다. 자연의 법칙의 힘에 대한 강도는 매우 강력하면서도 부드럽다. 시간적 존재의 파멸은 매우 천천히 가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체 어느 누구에게나 다가온다. 유한적 삶은 이미 나를 둘러 싼 인식과 체계, 집단, 의무, 이념들의 관계 속에서 시작한다. 나를 지탱하는 삶의 시간들은 보편적 이념들로 물들고 정당화 되어간다. 인식의 폭력, 관계의 폭력, 이념의 폭력, 체계의 폭력 등 수많은 폭력들은 체계화된 시간 속에서 알게 모르게 넓고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다. 즉, 디스토피아적 시간의 바탕은 유토피아의 시간을 갈망한다. 작업의 배경은 디스토피아적 환경, 즉, 수많은 체계들과 폭력, 그 속에 모호한 존재에 대한 인식을 수반한다. 그 위에 기쁨, 행복, 여유로움, 등등의 밝은 감정들이 수반되는 여러 행위들이 표현이 되어 현대인들의 이상적 현실에 대한 유토피아적 모습으로 전개된다.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어떤 것이 있는가?”, 종교적인 질문을 떠난 나의 본질에 대한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사회에 대한 인식을 보다 선명하게 해주는 화두이며, 존재의 인식에 대한 모호한 삶의 의식을 반영한다.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 사회체계 내의 현실적 삶과, 이를 벗어난 갈망적 이상의 삶이라는 경계의 혼돈 속에서 현대인들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한다.
학력
2004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2012 silent, gallery a-cube, 서울
2010 세상 끝 조우전, GALLERY SEED, 수원
2008 화원 안의 세상 - Fuman story shop전, 소미갤러리, 서울
2007 살아가야하는데...전, greemZip, 서울 / 갤러리 하루, 제주
단체전(selected)
2015 제6회 畵歌전 '경계의 자리', (재)한원미술관, 서울
2015 트라우마의 기록전,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경기 일산
2013 구로문화재단 기획 자연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전, 구로아트밸리갤러리, 서울
2013 Inside전, able fine art NY gallery, 서울
2011 상:像상:想, 형상에 시선이 머물다전, 갤러리 터치아트, 헤이리
2011 The New Faces at Next Door 2011전, next door 갤러리, 서울
2010 구로문화재단 기획relation전, 구로아트밸리갤러리, 서울
2010 가을 문화 향기(일곱 이방인의 방문)전, 쉼박물관, 서울
2010 드넓은 강원, 휘감는 젊음전, 박수근미술관 특별기획전, 강원
2010 Breathing House Project -I. Drawing-전, 키미아트, 서울
2010 Form&Formless전, Gallery Form, 부산
2009 Korea Tomorrow 2009 Bridge the World전, SETEC, 서울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이 나 림 Lee Narim
내가 머무는 공간을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그려낸다.
공간 속 사물들은 하루하루 나에 의해 혹은 타인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수동적인 움직임 속에서 나는 나의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거쳐 대학원을 다니며 스스로 잘 인지하고 있지 못했지만 사회가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체제 속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내가 관찰하는 실기실과 집, 사무실도 수동적이고 의무적인 행위들이 가득하고, 이 삶 자체가 어떠한 체제 및 정해진 틀 속의 수동적인 움직임들의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자유의지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회라는 공간(틀)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가?
움직이는 것인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인가?
학력
201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재학 중
2013 성신여자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단체전(selected)
2015 제6회 畵歌전 '경계의 자리', (재)한원미술관, 서울
2014 416_15전, 성신여자대학교 수정관(가온박물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