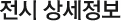

The Silence<2013-04>, 디지털 프린트, 가변크기, 2013
플레이스막은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송미경 작가의 개인전 <침묵: 우리는 살고있다>展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라져가는 것들을 위하여
사람이 살았던 자리, 삶이 있던 자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그 소리들이 사라져 버렸을 때, 작가는 머지않아 그곳도 곧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간은 텅 비어 있었고, 남아있는 것은 폐허된 건물과 침묵뿐이었다.
송미경 작가의 첫 개인전 <침묵: 우리는 살고 있다>는 재개발지역인 안양시 덕천마을을 영상으로 담고 있다. 작가는 자신이 20년 넘게 살아온 지역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과정을 기록하기로 결심한다. 2006년부터 재개발지역으로 확정되어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던 이 지역은 2013년쯤엔 100여명의 거주민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작가는 그 해부터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작업을 마칠 때쯤 덕천마을은 완전히 사라졌다.
기억을 기록하는 방법
폐허가 된 공간, 생의 기운이 빠져나간 지역에서 받았던 첫인상은 비어있음이었고, 그것은 곧 상실을 의미했다. 공간의 상실은 그 안에서 생성된 기억의 상실과 함께 훗날 사람과 사람, 세대와 세대를 이어줄 수 있는 추억의 연결고리 역시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했다.
기억을 기록하기 위해서 시작된 이 작업은 ‘침묵 프로젝트’ 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름처럼 이곳을 기억하고 다녀간 누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듯, 작가는 텅 빈 공간에 ‘침묵’이라는 글자들을 스프레이로 새겨두었다. 곧 사라질 것이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기억되는 장소, 그 안의 모습, 침묵마저도 모두 기록되었다. 그리고 예전에 이곳에 가득 차 있던 삶의 소리를 불러들이듯 폐허가 된 공간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텅 빈 공간에 소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통해 작가는 이곳을 기억하고자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실을 위로하고 달래고자 하였다. 이 퍼포먼스는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전시 오프닝 당일 날, 재현될 예정이다.

The Silence<2013-09>, 디지털 프린트, 가변크기, 2013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과정 속에서도 삶은 여전히 지속된다.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침묵했던 폐허된 지역, 이곳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살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스프레이로 표시된 문구들은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작가가 새겨둔 ‘침묵’이라는 글자를 제외한 다른 문구들은 주민들 스스로가 적은 것들이다.
전시장에 설치된 두 대의 영상물 중 하나는 작가의 시선을 통해 이곳의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물이며 다른 하나의 경우, 새로운 시선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두 대의 카메라로 촬영을 했던 작가는, 어느 날 카메라를 설치하던 중, 한 대의 카메라를 분실하게 된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찾은 카메라는, 전원이 꺼지지 않은 채로 계속 작동되고 있어 분실과정을 모두 담고 있었다. 몇 번이고 행방을 물었지만 ‘모른다’로 일관되었던 주민들의 대답. 그리고 그분들 중 한명이었던 중국집 사장님의 손으로 옮겨진 카메라. 그것은 어쩌면 작가가 이 지역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듯이, 누군가 여전히 이곳에서 살고 있음을 온 몸으로 표현했던 주민들의 의사였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그곳에서 살아왔으며, 여전히 살고 있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싶음을 말이다.
오늘날 도시화의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점은, 개발이라는 이름에 가려진 지역 주민들의 보장받지 못한 삶일 것이다. 이것은 비단 덕천마을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일수도 있음을 기억 하며, 이 시간에도 사라져 가는 이름 모를 기억들을 위하여, 짧은 애도의 묵념을 남긴다.
■ 한수지
FAMILY SITE
copyright © 2012 KIM DALJIN ART RESEARCH AND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이 페이지는 서울아트가이드에서 제공됩니다. This page provided by Seoul Art Guide.
다음 브라우져 에서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This page optimized for these browsers. over IE 8, Chrome, FireFox, Safari